
-
-
“케이크 안 팔면 제과점 아니다?”… 수원시 정자동 제과점 분쟁, 상생협약을 무력화하는 대기업의 ‘자의적 업종 기준’
-
상생을 말하면서 상생을 피하는 구조… 매출 80% 급감을 겪는 1인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
수원시 정자동의 한 대기업 제과 프랜차이즈가 ‘케이크 상시 판매 여부’를 이유로 인근 1인 영세 자영업 제과점을 상생협약 대상에서 배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상생협약의 실효성과 업종 판단 기준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케이크 안 팔면 제과점 아니다?' 참고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제작=문서준기자) 국세청에 ‘일반음식점 제과점’ 업종으로 정식 사업자등록을 하고 빵을 제조·판매해 온 수원시 정자동의 한 1인 영세 자영업 제과점은 대기업 제과 프랜차이즈의 신규 입점 과정에서 상생협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을 겪었다. 해당 프랜차이즈 측은 “케이크를 상시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제과점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 기준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현행 식품위생법이나 국세청 업종 분류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특정 품목의 상시 판매 여부를 이유로 업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제도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역의 다수 제과점은 케이크를 주력 상품으로 삼지 않더라도 제과점으로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판단이 단순한 해석 논쟁을 넘어, 1인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제과점은 대기업 제과점 입점 이후 매출이 약 8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와 원재료비, 각종 고정비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1인 영세 자영업 구조에서 매출 급감은 곧 폐업 위기로 직결된다.상생협약의 취지는 대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의 공존을 도모하는 데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관리하는 상생협약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약속한 제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럼에도 기업이 내부 상품 구성 기준을 앞세워 영세 자영업자의 업종 지위를 부정할 수 있다면, 상생협약은 선언적 문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유통업계에서는 “케이크를 상시 판매하지 않는 제과점은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라며 “이 같은 기준이 용인될 경우 상생협약의 적용 범위는 기업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상생의 기준이 제도와 법이 아닌 기업 내부 판단에 맡겨질 경우, 지역 상권과 공정 거래 질서가 구조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해당 1인 영세 자영업 제과점 운영자는 즉각적인 소송이나 강경 대응 대신, 기업에 공식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 해석 요청 및 참고자료 제출 형식의 문제 제기를 진행 중이다. 그는 “기업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이 문제가 개인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잘못된 선례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업종 판단이 기업 내부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 질서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상생협약이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너질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공정거래 차원의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이번 수원시 정자동 제과점 분쟁은 단순한 개별 사례를 넘어, ‘상생협약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상생을 약속한 제도가 현장에서는 기업의 해석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다면,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결국 1인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그 고통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답변이 요구되고 있다.※ 챗GPT 사용 기사편집·가공 포함
Copyrights ⓒ 아시아연합뉴스 & www.asia-new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글쓴날 : [26-01-12 18:5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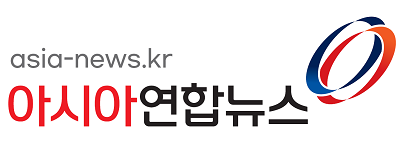
대표자명: 문서준 | 상호: 주식회사 아시아연합뉴스
주소: (063-14)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1길 28, 3층190
신문등록번호: 서울,아55716 | 신문등록일자: '24.11.26 | 발행인 / 편집인: 문서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문서준
전화번호: 0507-1480-2997 | Fax번호: 0504-288-3997 | 이메일: asianews@asia-news.kr
메타(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asianews












